금을 만들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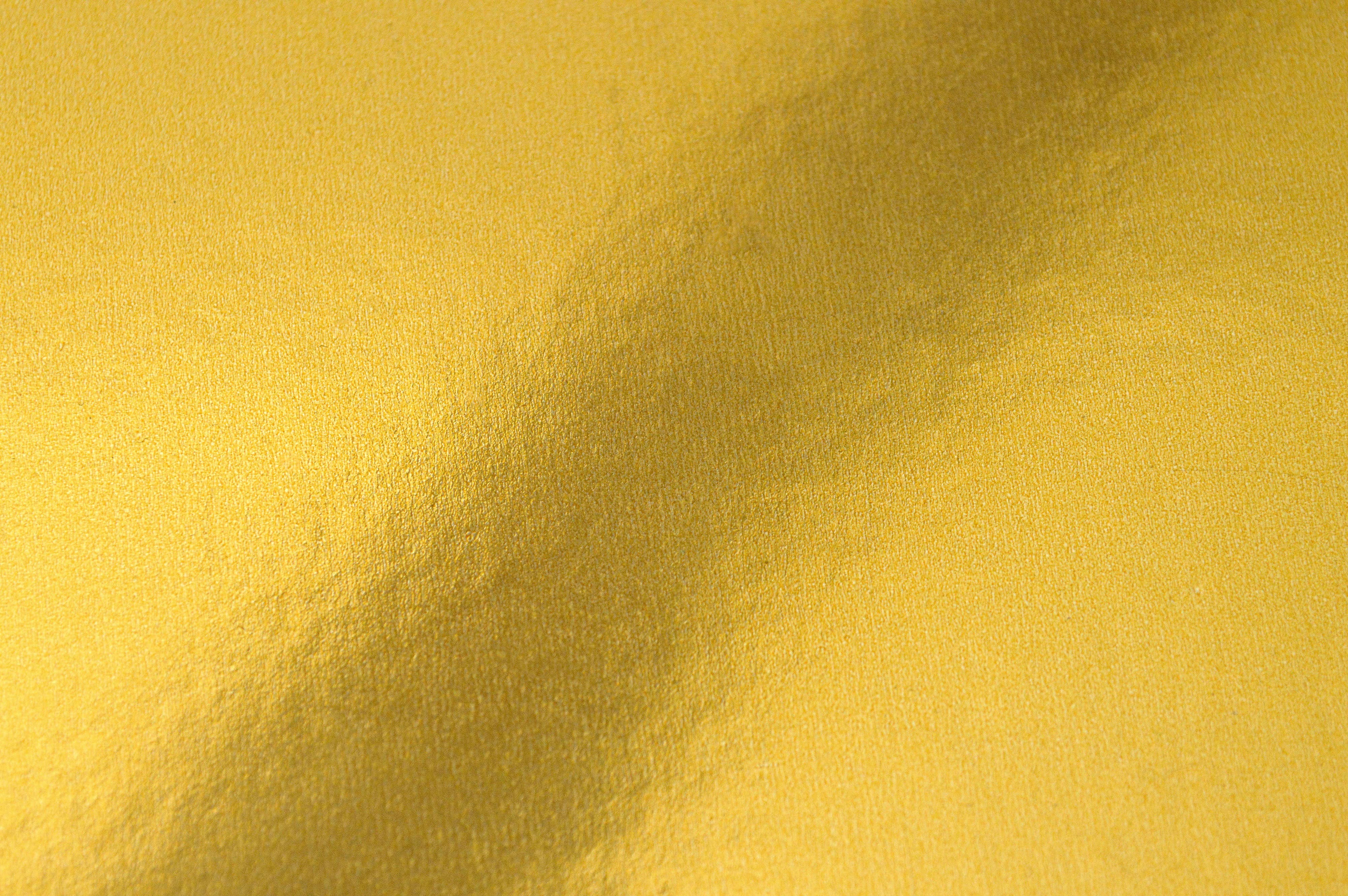
금을 만들 수 있을까?
금(Au, 원자번호 79)은 인류 역사에서 귀중한 금속으로 여겨져 왔다. 연금술사들은 수세기 동안 납이나 구리 같은 저렴한 금속을 금으로 바꾸려 했지만 실패했다.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 금을 ‘만들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흥미롭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기술적, 경제적, 윤리적 장벽이 존재한다.
연금술의 꿈과 현대 과학
중세 연금술사들은 ‘철학자의 돌(Philosopher’s Stone)’을 찾아 비금속(Base Metal)을 금으로 변환하려 했다. 이는 화학적 반응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시도였다.
19세기 말 원소 주기율표가 완성되고 원자 구조가 밝혀지면서 금이 단순한 화합물이 아니라 고유한 원소임이 확인되었다. 금은 79개의 양성자와 특정 수의 중성자로 구성된 핵을 가지며, 이를 바꾸려면 원자핵 수준의 변환이 필요하다. 현대 과학은 연금술의 꿈을 핵물리학으로 재해석하며 금을 만드는 이론적 가능성을 열었다.
핵변환(Nuclear Transmutation)은 원소의 원자핵을 바꿔 다른 원소로 만드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금이 아닌 원소를 방사선이나 입자 충돌로 변환해 금을 생성할 수 있다.
이는 연금술이 꿈꾼 화학적 변환이 아니라 물리적 과정이다. 20세기 초 과학자들은 이런 원리 발견에 몰두했으며, 실제로 금을 합성한 실험이 기록되어 있다.
핵반응을 통한 금 합성
금은 자연에서 주로 별의 초신성 폭발(Supernova)이나 중성자별 충돌(Neutron Star Collision)을 통해 생성된다. 지구의 금은 이런 우주적 사건의 산물로, 약 46억 년 전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실험실에서 이를 재현하려면 강력한 입자 가속기(Particle Accelerator)나 원자로가 필요하다. 1941년, 미국 물리학자 글렌 시보그(Glenn Seaborg)는 수은(Hg, 원자번호 80)을 금으로 변환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수은-197 동위원소에 중성자를 쏘아 방사성 금-198을 만들었다가 안정적인 금-197로 변환시켰다.
또 다른 방법은 백금(Pt, 원자번호 78)에 양성자를 추가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백금-195에 양성자를 충돌시키면 금-196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은 극히 비효율적이다. 시보그의 실험에서는 수십억 개의 원자를 변환했지만, 결과물은 나노그램(ng) 단위에 불과했다. 이는 현미경으로도 보기 어려운 양이며, 상업적 생산과는 거리가 멀다.
게다가 생성된 금은 종종 방사성 동위원소여서 안정적인 금(Au-197)이 되려면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
기술적 한계와 에너지 비용
금 합성의 가장 큰 장벽은 에너지와 비용이다. 입자 가속기나 원자로를 가동하려면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며, 이는 금값보다 훨씬 비싸다. 예를 들어, CERN의 대형 강입자 충돌기(LHC)는 초당 수십만 번의 입자 충돌을 일으키지만, 금을 만들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실험실에서 만든 금 1그램의 비용은 자연 금 1킬로그램을 채굴하는 비용을 훨씬 초과한다. 현재 금 1그램 가격이 약 10만 원(2025년 기준 추정)이라면, 합성 금은 수백만 원 이상 들 수 있다.
또한 핵반응은 위험성을 동반한다. 방사성 부산물이 생성되며, 이를 처리하려면 엄격한 안전 규제가 따른다. 금 합성은 과학적 호기심을 충족할 수는 있어도 실용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다.
자연 금은 지구 껍질에 약 0.004ppm(백만분의 4) 존재하며, 채굴 기술로 충분히 얻을 수 있다. 굳이 인공적으로 만들 이유가 부족한 셈이다.
자연에서 금을 얻는 대안
금 합성이 비현실적이라면, 자연에서 금을 더 효율적으로 얻는 방법은 어떨까? 해저 열수구(Hydrothermal Vents)나 강바닥 퇴적물에서 금 미립자가 발견되며, 미생물이 금을 농축한다는 연구도 있다.
예를 들어, 큐프리아비두스 메탈리듀란스(Cupriavidus metallidurans)라는 박테리아는 금 이온을 흡수해 순수 금으로 변환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이런 생물학적 방법도 소량 생산에 그쳐 상업적 대안이 되기 어렵다.
우주에서는 소행성 채굴(Asteroid Mining)이 주목받는다. 소행성 16 Psyche는 금, 백금 등 귀금속이 풍부한 것으로 추정되며, NASA는 2026년 탐사선을 보낼 계획이다. 그러나 소행성에서 금을 가져오는 것도 수십 년 이상의 기술 개발과 천문학적 비용이 필요하다. 결국 자연 금을 대체할 현실적 방법은 아직 요원하다.
실생활에서의 의미와 윤리적 고민
금 합성이 실현된다면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까? 금은 장신구, 전자제품(반도체), 화폐 가치 보존에 사용된다. 인공 금이 대량 생산되면 금값이 하락해 경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반대로, 합성 기술이 극소량에 머물면 과학적 성취로만 남는다.
예를 들어, 반도체에 필요한 미량의 금을 합성으로 조달한다면 채굴로 인한 환경 파괴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방사성 폐기물 처리와 에너지 낭비는 새로운 환경 문제를 낳는다.
윤리적으로는 금 합성이 정당한가라는 질문도 있다. 금의 희소성이 가치를 만든다면, 인공 금은 그 상징성을 훼손할 수 있다. 또한 이런 기술에 투자할 자원을 기후 변화나 빈곤 해결에 쓰는 것이 낫다는 주장도 있다. 금을 만드는 능력은 인간의 탐욕과 과학의 경계를 시험하는 문제다.
결론
금은 핵변환으로 만들 수 있지만, 엄청난 에너지 비용과 비효율성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 자연 금은 우주적 과정으로 이미 충분히 존재하며, 채굴이나 대안적 방법이 더 실용적이다. 인류는 금을 합성할 꿈을 이룰 수 있으나, 그럴 필요와 가치가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3줄 요약
1. 금은 핵반응으로 합성 가능하지만, 비용과 기술적 한계로 실용적이지 않다.
2. 자연 금은 우주에서 생성되며, 채굴이 인공 합성보다 효율적이다.
3. 금 합성은 과학적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경제적, 윤리적 이유로 실생활 적용은 어렵다.
'나만 궁금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멀티버스의 가능성에 대한 탐구 (0) | 2025.03.08 |
|---|---|
| 인류 멸종 시나리오 (0) | 2025.03.08 |
| 무한동력 진짜 안됨? (0) | 2025.03.07 |
| 빛의 속도 측정하기, 빛의 속도로 차여본 적 있나요? (0) | 2025.03.07 |
| 얼음은 왜 미끄러울까? (0) | 2025.03.07 |
| 화성으로 이주할 수 있을까? 언제 가능할까? (0) | 2025.03.07 |
| 초전도체란 무엇인가, 상용화될 수 있을까? (0) | 2025.03.07 |
| 내기를 하자고 한 사람이 지는 이유 (0) | 2025.03.07 |



